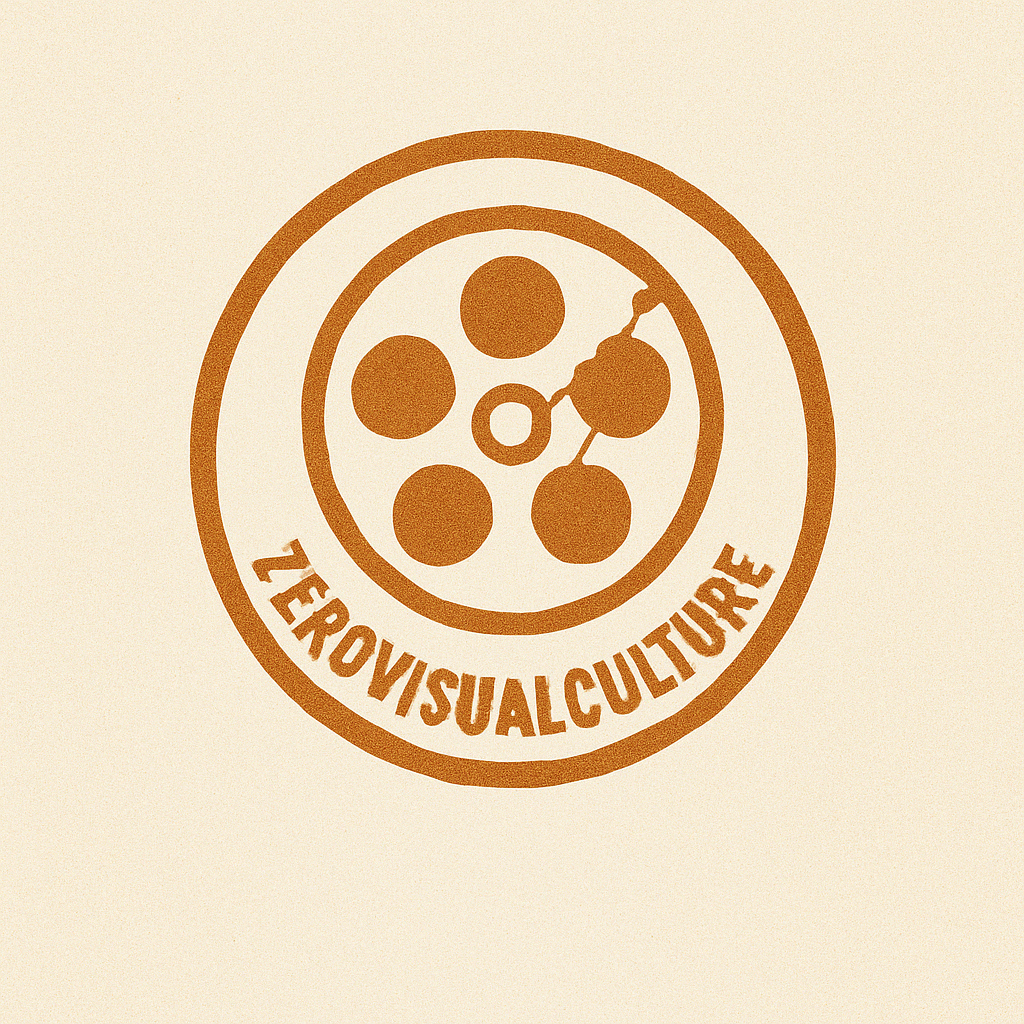Transparencies on Film by Theodor W. Adorno
※ 이 글은 New German Critique, No. 24/25, Special Double Issue on New German Cinema (Autumn, 1981- Winter, 1982), 199-205. 이 에세이는 1966년 11월 18일자 『디 차이트(Die Zeit)』에 실린 글을 바탕으로 하며, 이후 테오도어 W. 아도르노의 『Ohne Leitbild』(프랑크푸르트/마인: 수어캄프, 1967)에 수록되었다. 번역은 Thomas Y. Levin의 영어본을 따른다.
목차
1. 아버지의 영화
2. 거짓말과 해독제
3. 사실주의 영화 비판
4. 몽타주의 딜레마
5. 결론
만약 자기 검열자들의 말을 다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화를 그것이 수용되는 맥락과 대면시키기로 한다면, 영화의 의도에 주로 의존하고 그 의도와 실제 효과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간극을 소홀히 했던 기존의 전통적 내용 분석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간극은 매체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텔레비전"(3) 분석에 따르면, 영화는 다양한 층위의 행동 반응 패턴을 수용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산업이 제공하는 공식적 모델들, 즉 공식적으로 의도된 이데올로기가 관객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모델들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만약 경험적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마침내 어떤 성과로 이어질 만한 문제를 찾으려 한다면, 이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될 자격이 있다. 공식 모델들과 겹쳐 있는 수많은 비공식 모델들이 있는데, 이들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제공하지만, 공식 모델들에 의해 무력화될 의도로 설정된다. 소비자들을 포획하고 대체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이고, 다르게 말하면 이단적 이데올로기를 이야기의 도덕성에 맞는 수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육감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타블로이드 신문은 매주 이러한 과잉 표현의 사례를 제공한다. 여러 금기에 의해 억압된 대중의 리비도가, 바로 이 행동 패턴들이 허용되는 사실 자체를 통해 일종의 집단적 승인 요소를 반영하기 때문에, 더욱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플레이보이, 돌체 비타, 와일드 파티들에 맞서려는 의도를 항상 보이지만, 관객은 섣부른 도덕적 판단보다 이들을 바라볼 기회를 오히려 더 즐긴다. 오늘날 독일, 프라하, 심지어 보수적인 스위스와 가톨릭의 로마에서도, 남녀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서로 껴안고 거리낌 없이 키스하는 모습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은, 파리의 방탕 생활을 민속처럼 판매하는 영화들에서 배운 결과일 것이다. 대중을 조작하려는 문화 산업의 이데올로기는, 지배하려는 사회 자체만큼이나 내부적으로 모순적으로 된다. 문화 산업의 이데올로기는 자기가 한 거짓말에 대한 해독제를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문화 산업을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항변이다.
영화의 사진적 과정은 본질적으로 재현적이기 때문에, 미학적으로 자율적인 기법들과는 달리, 주관성에 낯선 대상으로서의 사물에 더 높은 내재적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것이 예술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영화가 가지는 지체된 측면이다. 영화가 가능한 한 대상들을 해체하고 변형한다 해도, 그 분해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영화는 절대적 구성(construction)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화의 구성 요소들은 아무리 추상적이라 해도 항상 무언가 재현적인 성격을 지니며, 결코 순수하게 미학적 가치들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회는 회화나 문학 같은 고급 예술에 투영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훨씬 직접적으로, 영화에 대해 사물들의 측면에 자신을 투영한다. 영화 속 대상들에서 환원 불가능한 것은, 지향의 미학적 현실화 이전에 이미 사회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영화의 미학은 본질적으로 사회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영화에 대한 미학은, 심지어 순수하게 기술적인 미학조차도, 영화의 사회학을 포함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영화에 대한 크라카우어의 이론은 사회학적 절제를 표방하지만, 그 결과 그의 저서에서 빠져 있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반형식주의는 오히려 형식주의로 변질된다. 크라카우어는 영화가 일상적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매체로 찬양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결의를 아이러니하게 다룬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당시 유겐트슈틸(Jugendstil) 프로그램이었으며, 떠다니는 구름이나 흐릿한 연못이 스스로 말하게 하려는 모든 영화들도 결국 유겐트슈틸의 유물에 불과하다. 이들 영화는 주관적 의미로부터 정화되었다고 믿는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저항하려 했던 바로 그 의미를 대상에 주입하게 된다.
각주
(3) T. W. 아도르노, 「이데올로기로서의 텔레비전」, 『개입: 아홉 가지 비판적 모델』(프랑크푸르트: 수어캄프, 1963), 81–98쪽. 이 글은 영어 원문 “How to Look at Television”을 바탕으로 하며, 원래는 The Quarterly of Film, Radio and Television 제7권 (1954년 봄호), 213–235쪽에 게재되었고, 이후 B. 로젠버그와 D. 매닝 화이트 편, 『대중문화: 미국의 대중예술』(뉴욕: 프리 프레스, 1957), 474–488쪽에 “Television and the Patterns of Mass Culture”라는 제목으로 재수록되었다. (영어 역자 주석)
◀ 이전 글 보기: 1. 아버지의 영화
▶ 다음 글 보기: 3. 사실주의 영화 비판
'번역 아카이브 > 아도르노: 영화에 담긴 투명성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도르노 번역] 영화에 담긴 투명성들 (5/5) (1) | 2025.05.02 |
|---|---|
| [아도르노 번역] 영화에 담긴 투명성들 (4/5) (4) | 2025.05.02 |
| [아도르노 번역] 영화에 담긴 투명성들 (3/5) (0) | 2025.05.02 |
| [아도르노 번역] 영화에 담긴 투명성들 (1/5) (2) |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