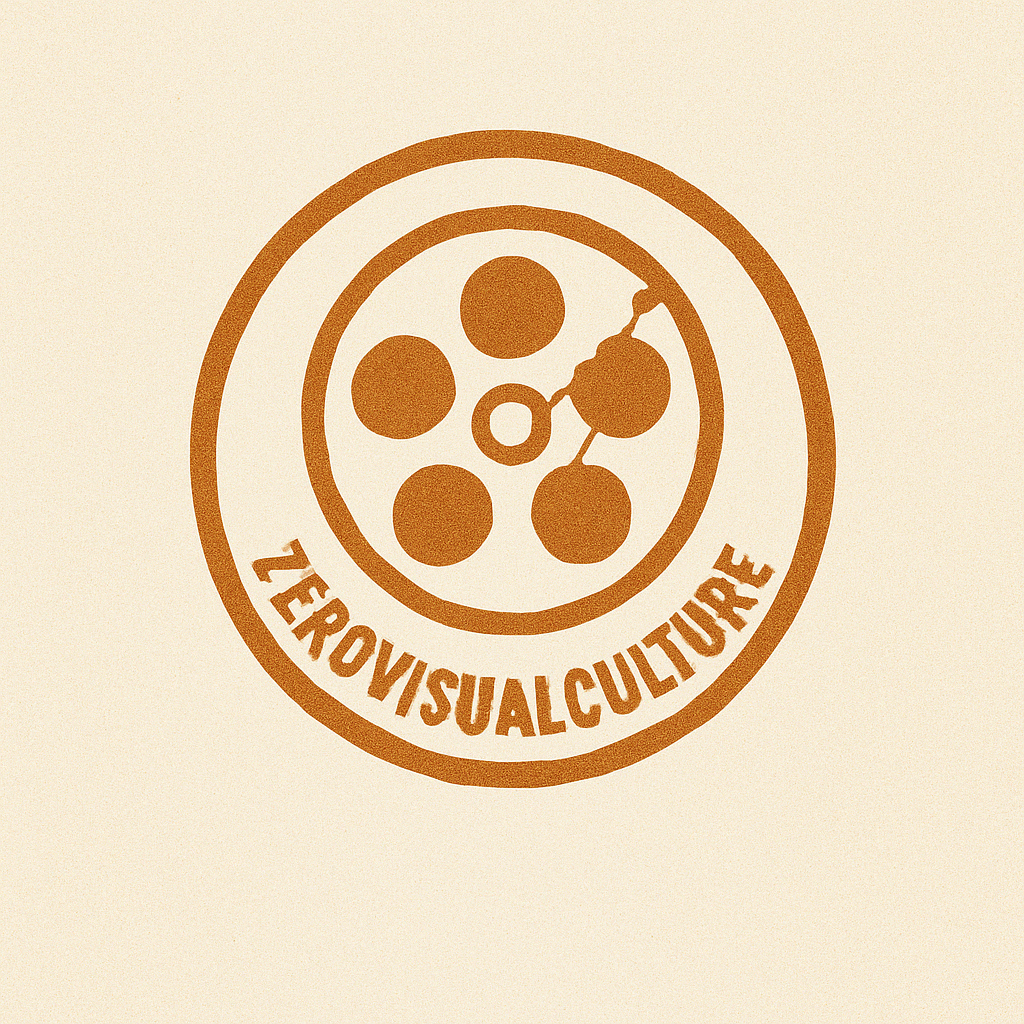아감벤의 '인류학적 기계'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원작『피노키오』에 가장 충실한 동화로 만들어 냈지만, 『피노키오』는 지금까지 다양한 해석을 낳은 작품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아감벤은 『피노키오』의 결말에서 보여주는 인간으로의 통합은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는 카를로 콜로디의『피노키오』는 ‘인류학적 기계’가 비활성화되고 정지된 동화라고 읽은 바 있다. 여기에서 ‘인류학적 기계’는 인간과 비인간(특히 동물)의 차이를 통해 인간을 정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기계 장치는 존재 본연에 내재해 있는 비합리적 동물성을 억누르며 인간(이성과 언어를 지닌 존재)을 정의한다. 그런데 꼭두각시 인형 동화(『피노키오』)에서는 잘 작동하던 이 인류학적 기계가 매번 방해받고 가로막힌다.(4)
아감벤은 크게 피노키오를 모험적 본성과 아이 본연의 천진난만함과 왕성한 호기심을 지닌 꼭두각시 피노키오, 그 꼭두각시 피노키오의 본성이 극적으로 표출된 당나귀, 순응적이며 길들여진 규범적 성격을 지닌 착한 진짜 인간 피노키오라는 세 개의 분할된 주체라고 주장한다. ‘피노키오의 우주에는 꼭두각시, 동물, 인간이라는 세 가지 단순한 본체 혹은 요소가 있을 뿐이다.’(5) 선함과 악함 혹은 착함과 나쁨이라는 규범이 인간이 되는 조건이라면, 원래의 피노키오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착한 아이가 곧 인간이라면, 꼭두각시 피노키오와 피노키오가 변신한 당나귀는 또 누구인가. 꼭두각시 피노키오는 아이처럼 말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달릴 수 있는 운동 감각을 갖고 있다. 동시에 피노키오 자체가 나무로 빚어졌기 때문에 피노키오는 자연에서 온 존재라는 의미도 지닌다. 꼭두각시 피노키오는 아이의 지각 기능을 하고 있지만,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생명체로서의 아이와 다르고, ‘착한 아이’와도 다른 이중 구속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꼭두각시 피노키오의 정체성은 꼭두각시 나무 인형에서, 장난감 나라에서 당나귀라는 동물로, 마지막에는 결국 착한 아이가 되어 인간이 되는 정체성의 변화를 거치지만, 그 세 존재는 매끄럽게 통일되지 못한다. 인류학적 기계의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은 실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감벤은 인간성의 기원은 오히려 인류학적 기계에 의해 훼손된 혹은 인류학적 기계가 (재)생산한 착한 인간 피노키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꼭두각시 피노키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아감벤에게 인간성 혹은 인간다움이란 인류학적 기계에 의해 강탈당해서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신비로움을 간직한 이름 없는 어떤 것이며, 그것이 생명이고 생기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생기 vitality’라는 개념을 정의해야 할 듯하다. 아감벤의 인류학적 기계를 구분한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인간, 동물, AI 등을 포스트휴먼의 경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생기 혹은 생명력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매개 개념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기 (vitality)
생기 혹은 생명력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나온 개념이다. 하나는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다니엘 스턴(Daniel Stern)의 ‘생기있는 정동(vitality affects)’의 맥락이다.(6) 유아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유아에게 건네는 몸짓, 눈빛, 언어, 노래의 특정한 리듬, 높낮이, 강도, 흐름을 유아가 경험할 때 아이는 비로소 ‘생기’를 띤다. 여기에서 생기 혹은 생명력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과 호혜성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된다. 데보라 레빗은 애니메이션 등 각종 매체 경험을 비롯한 아바타, 시뮬레이션, 로봇 등의 이미지 혹은 비인간과의 상호작용적이며 정동적인 경험으로 생기 개념을 확장한다. 심지어 “영화에서 역동적인 컷이나 화가의 선의 움직임 등”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사유, 기억, 판타지 등의 정동적 효과를 일으킨다면 인간인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다 aliveness’”(7)고 느낀다고 보았다. 두 번째 생기 개념은 비인간 혹은 무기체의 자기조직화의 맥락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생기’는 인간처럼 자의식이나 주관적인 경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내적 흐름과 요소들의 조합이라는 기계의 작동을 통해 자기조직화가 가능한 ‘존재의 힘’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생명력은 인간을 비롯한 유기체의 속성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로봇이나 AI 등의 기계적 생기로 확장될 수 있다. 언어를 구사하고 움직임이 가능한 기계의 힘을 지시하기 위해 기존의 ‘생기’ 개념은 전유되어 확장된다. 이 두 가지 생기 개념은 이후의 안티 피노키오에 관한 논의에서 안티 피노키오가 내재한 중요한 속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학적 기계’의 작동 오류, 즉 꼭두각시이자, 동물이자, 인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무엇도 아닌 피노키오는 과연 무엇인가? 피노키오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꼭두각시를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하는가? 아감벤이 꼭두각시, 동물, 인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피노키오를 보았다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피노키오를 한 마디로 인간 이후의 ‘지구에 묶여 있는 자(the earth-bound)’(8)로 해석한다. 동물, 식물, 인간, 자연, 기계 등은 모두 지구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생하는 ‘생기를 지닌’ 존재들이다. 상호 작용하며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를 변형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4) 조르주 아감벤, 박문정 역, 『피노키오로 철학하기』, 효형출판, 2021, 202~203쪽.
(5) 아감벤, 위의 책, 206쪽.
(6) Deborah Levitt, The Animatic Apparatus: Animation, Vitality, and the Futures of the Image, (Winchester, UK: Zero books, 2018), p.93.
(7) Ibid., p.94.
(8) ‘지구에-묶인 자’(the earth-bound)는 부르노 라투르의 용어로, 도나 해러웨이 Donna Jeanne Haraway 는 부르노 라투르의 이 용어를 빌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이든, 우리는 지구에-묶인 자들과 함께 만들-함께 될, 함께 구성할-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도나 해러웨이, 김상민 역,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툴루세-친족 만들기」,『문화과학』, 통권 97호, 문화과학사, 2019. 169쪽.
※ 이 글은 「피노키오, 안티 피노키오, AI」(현대영화연구, 2025) 를 연재용으로 편집 분할한 3 / 7 번째 글입니다.
'연구 글모음 > 피노키오,안티 피노키오, AI'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2. 안티 피노키오 2 : 어린이 기계 혹은 아이 로봇이 말하는 것 (0) | 2025.04.19 |
|---|---|
| 4.1. 안티 피노키오 2 : <피노키오>(2022) (0) | 2025.04.19 |
| 3.2. 안티 피노키오 1 : <A.I.>(2002) (0) | 2025.04.19 |
| 2. 피노키오의 모험 - 어느 꼭두각시의 이야기 (0) | 2025.04.18 |
| 1. 서론: 피노키오는 왜 다시 등장하는가? (0) |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