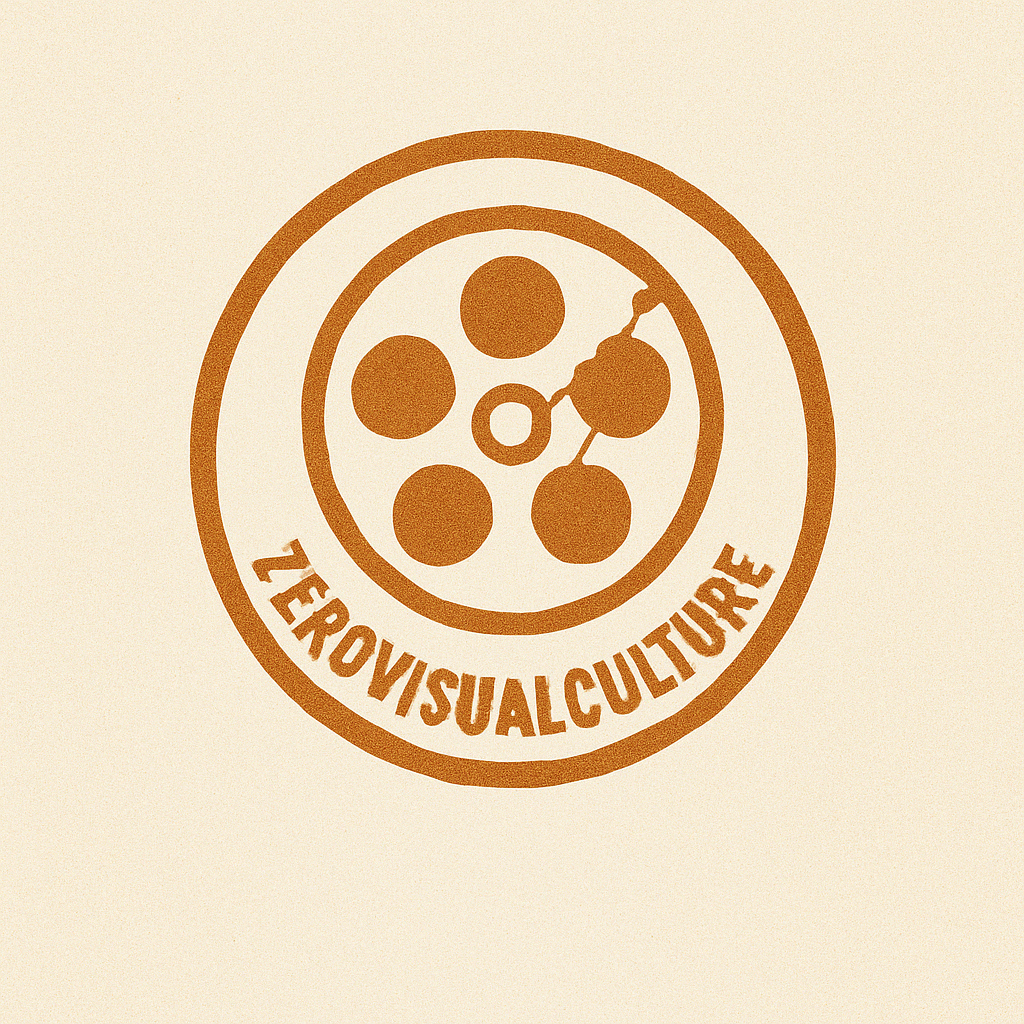케서린 헤일스(Katherine Hayles)는 천방지축인 아이들 조차도 일탈적이거나 어떤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가 어긋나지 않았다는 자기 합리화 서사를 만들어 규범을 지키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헤일스는 로봇과 같은 비인간의 서사가 아이들의 이러한 규범적 서사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질문한 바 있다.(14) 델 토로 감독의 피노키오에게 예상치 못한 행동이나 일탈적인 행동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경험(데이터)일 뿐이다. 그렇기에 아이들에게 발견되는 복종적인 규범의 내러티브가 요구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시대의 주류에 편승한 파시즘에 순종하는 어른들의 규범에도 복종하지 않는 어린이 기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15) AI를 포함한 비인간은 머신 러닝 등의 반복 학습과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낳은 파시즘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표현된다.
비인간의 죽음
둘째, <피노키오>는 비인간의 죽음을 주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원작 동화를 비롯한 여타 <피노키오> 영화와 구분된다. 델 토로 감독의 <피노키오>에서 죽음은 일종의 게임처럼 반복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피노키오는 크게 네 번 죽음을 맞이한다. 콜로디의『피노키오』에서는 푸른 요정만이 등장하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와 스필버그 감독의 <A.I.>에서도 푸른 요정만이 등장하지만, 델 토로 감독의 <피노키오>에서는 푸른 요정과 자매인 죽음이 등장해서 피노키오에게 죽음을 일러준다. 푸른 요정, 죽음, 토끼들, 세바스티안 J. 크로켓은 공통으로 남보라색을 띠면서 등장한다. 이들은 삶과 죽음의 일종의 림보 지대에 놓여 있는 생명들로서 삶과 죽음을 접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한다.
피노키오는 1910년대 파시즘이 지배하던 이탈리아라는 현실 공간과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남보라색 공간을 오가면서 죽음을 반복해서 맞이한다. 교통사고를 당해 죽고, 전쟁 중에 폭탄이 떨어져 죽고, 제페토를 구하다가 죽고, 인간 아이로 환생해서 제페토를 살리고 다시 죽는다. 이는 피노키오가 목각인형이든 인간이든 관계없이 피노키오라는 행위자(agency)는 삶과 죽음의 거대한 순환에 놓여 있는 공통의 존재라는 점을 보여준다.
남보라색에 솔방울 비늘 꼬리를 가진 반인반수 죽음은 피노키오가 처음 죽어서 찾아올 때 ‘넌 생명(life)을 가질 존재가 아니야. 의자나 탁자에 생명이 없듯이 그래서 넌 진정으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 넌 죽을 거야. 그것도 아주 여러 번. 이번처럼. 하지만 그건 진짜 죽음이 아니야’라고 피노키오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피노키오가 두 번째 죽어 찾아오자 죽음은 ‘삶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 영원한 삶에는 영원한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 넌 영원히 살겠지만, 네 친구와 사랑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거든. 언제 마지막이 될지는 마지막이 되어 봐야 알겠지’라면서 친구와 사랑하는 이들이 생긴 피노키오에게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일러준다. 제페토를 살리려다가 물에 빠져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한 피노키오에게 죽음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면 넌 영생을 잃게 돼. 제페토를 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넌 죽게 된다. 그게 네 마지막 생이 될 거야’라면서 모래시계를 피노키오 스스로 깨뜨리면 영생을 잃고 인간 아이가 될 거라고 말한다.
인간 아이처럼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피노키오는 제페토를 위해 영생을 버리고 인간 세계를 선택한다. 여기에서 영생은 그저 또 다른 생명의 삶의 방식일 뿐이다. 생명과 그것의 삶은 인간만이 지닌 게 아니라 기계든, 목각인형이든, 동물이든, 괴물이든 비인간 또한 각자의 방식을 지닌 생명체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는 피노키오의 생사를 모호하게 남겨둔다. 세바스티안 말대로 ‘세상을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떠난다.’ 이쯤 되면 폐기물로 버려진 기계 또한 나이 들어 죽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기를 지닌 존재라 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으로서의 피노키오, 생기를 지닌 존재
<피노키오>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간과 AI 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스트휴먼 영화라고 할 수 있다. ‘피노키오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대신에 인간과 AI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함께 살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비인간을 도구화하던 세대가 끝이 나고 피노키오와 함께 공진화하는 포스트휴머니즘 세대의 서막을 알린다.’(16)
<피노키오>는 크게는 선과 악의 절대적 상대성을 숙고하게 하면서 파시즘 시대와 같은 뒤틀린 세상에서 무조건 복종하거나 누구에게도 예속되길 원하지 않는 안티 피노키오를 제시한다. 인간의 유한성의 권리 또한 학습하면서 성장하여, 죽음이 인간 고유의 권한이 아닌 더 큰 생태계의 순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절대적 원리라는 걸 보여준다. 그 시스템에서는 꼭두각시, 동물, AI, 기계, 인간 등은 모두 생기를 지닌 존재들이며,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 없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들이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인류학적 기계는 작동을 멈추고, 생기의 정동을 통해 지구에 묶인 존재들은 공생한다. 동시에 죽음이나 인간성 등의 인간중심주의적인 사유는 이제 포스트휴먼 시대에 새롭게 ‘생기’라는 개념으로 재배치된다. 그것이 <피노키오>가 보여주는 포스트휴먼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 N.캐서린 헤일스 지음, 『나의 어머니는 컴퓨터였다: 디지털 주체와 문학 텍스트』, 앞의 책, 300쪽. 캐서린 헤일스는 예상치 못한 아이들의 행동이 가장 활발하게 내러티브를 창조하도록 자극한다고 보았지만, 동시에 특이하거나 일탈적인 행동 즉 비규범적인 행동이 제시되면, 아이들은 그것을 예외로 구분해서 예측이 갖는 사회적 구조를 유지하게 해준다고 보았다. 즉 아이들은 일탈적인 행동을 규범적인 내러티브로 봉쇄한다.
(15) 델 토로 감독은 인터뷰에서 피노키오를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아웃사이더 캐릭터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예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 손끝에서 빚어낸 시네마>(넷플릭스 제작, 2022)
(16) 지여정, 앞의 논문, 30쪽.
※ 이 글은 「피노키오, 안티 피노키오, AI」(현대영화연구, 2025)를 연재용으로 편집 분할한 6 / 7 번째 글입니다.
'연구 글모음 > 피노키오,안티 피노키오, AI'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 결론 : 생기있는 로봇 (0) | 2025.04.19 |
|---|---|
| 4.1. 안티 피노키오 2 : <피노키오>(2022) (0) | 2025.04.19 |
| 3.2. 안티 피노키오 1 : <A.I.>(2002) (0) | 2025.04.19 |
| 3.1. 안티 피노키오 1 : 아감벤의 '인류학적 기계' (0) | 2025.04.18 |
| 2. 피노키오의 모험 - 어느 꼭두각시의 이야기 (0) |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