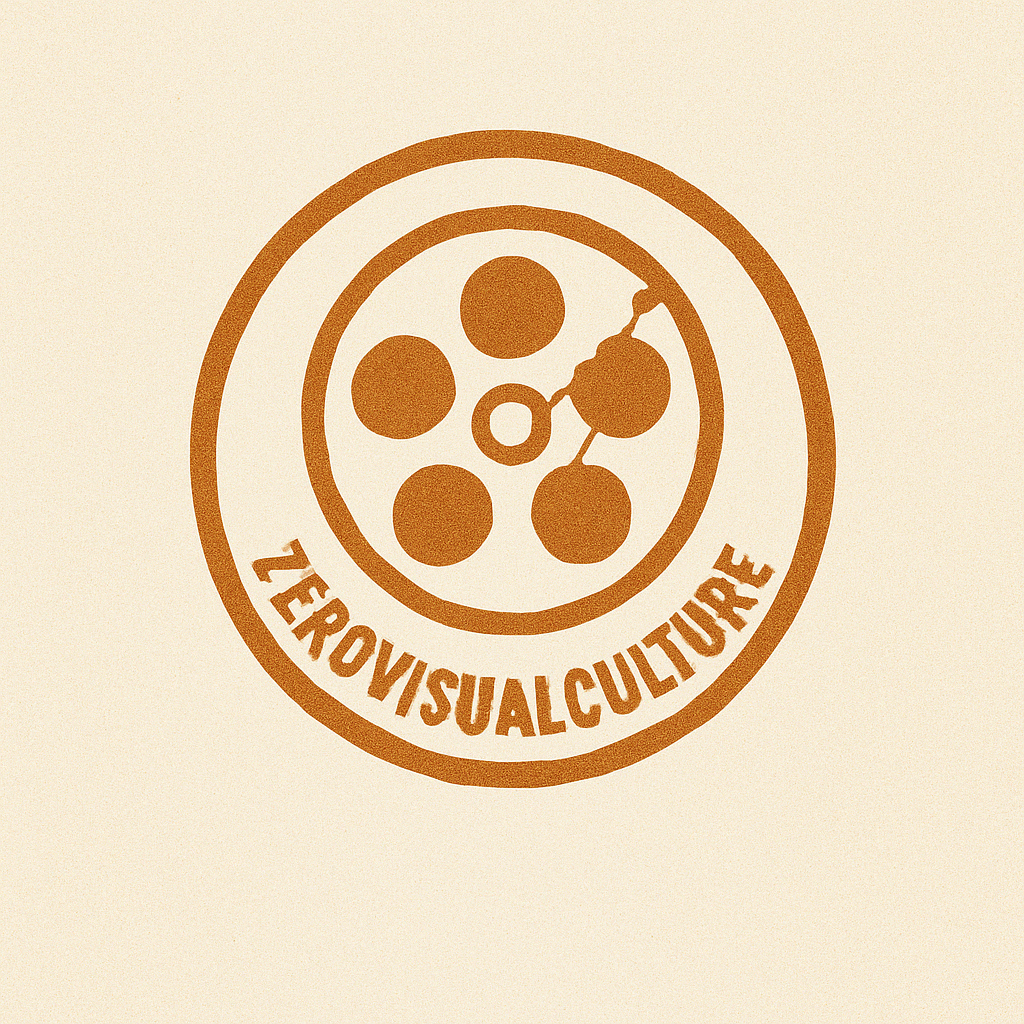마음을 가진 기계
<A.I.>에서 AI 피노키오인 데이비드(헤일리 조엘 오스먼드)는 콜로디의 『피노키오』에서 피노키오와는 정반대로 어른들의 말에 정확히는 창조자의 말에 지나치게 순응하는 AI 로봇이다. <A.I.>는 온실 효과로 인해 이상 기후와 굶주림이 발생한 디스토피아 지구에서 시작한다. 그곳에서 인간들은 먹지 않고 자원도 소비하지 않는 로봇을 만들어 지구에서의 인간의 생존을 도모한다. 데이비드는 로봇 생산기업인 사이버트로닉스사가 최초로 개발한 로봇 차일드로서 데이비드는 부모를 영원히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콜로디의 『피노키오』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어른들의 말에 순응하는 아이가 인간의 기준이라면, 데이비드는 이미 인간 아이이다. 그러나 AI 피노키오인 데이비드는 유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류학적 기계에 포획된다. 영원히 늙지 않는 AI 피노키오는 엄마를 너무나 사랑해서 유한한 생명과 영혼을 지닌 인간 되기를 원한다.
데이비드는 인간 엄마인 모니카가 들려주는 피노키오 동화를 듣고 자신이 진짜 소년이 되면 엄마가 자신을 영원히 사랑해줄 것임을 믿는다. 그리하여 자신을 실제 살아있는 소년으로 만들어 줄 푸른 요정을 만나는 모험을 떠난다. 콜로디의 『피노키오』에서 등장하는 제페토는 로봇 차일드를 만들어 죽은 자신의 아들인 데이비드를 대체하려는 사이버트로닉스사의 하비 박사(제임스 하트)로 바뀌었고, 장난감 나라는 지골로 로봇인 조(주드 로)와 함께 떠난 환락의 도시인 루즈 시로 각색되었으며, 푸른 요정과 그녀의 정령들이 사는 숲은 사이버트로닉스사에 의해 폐기된 로봇 쓰레기장이라는 어둡고 음습한 장소로 변해 있다.
<A.I.>는 첫 시퀀스에서 이미 이 영화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질문 혹은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을 제시한다. 영화의 첫 시퀀스는 아이 대체 로봇에 대해 집단 토론을 벌이는 사이버트로닉스사의 하비 박사 연구실이다. 토론 중 하비 박사에게 한 여성이 묻는다. 하비 박사가 말하는 마음을 가진 기계, 즉 진화신경망을 통해 꿈, 직관, 은유의 정신적인 세계를 가져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입력된 아이 대체 로봇이 제작된다면, 인간은 그들을 친자처럼 사랑할 수 있는지, 로봇이 우리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 인간인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 윤리적인 물음은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즉 <A.I.>는 아이 대체 로봇을 비롯한 AI 로봇과 함께하는 세계에서 인간은 이들과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한다. 그야말로 AI 피노키오와 인간은 어떻게 공생하고 공진화할 수 있느냐는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메카와 올가
<A.I.>에서 데이비드는 콜로디의 피노키오만큼이나 여러 번 인간/비인간을 오간다. 콜로디의 피노키오가 꼭두각시, 동물, 인간을 구분 지으면서 인간성을 구축해 나갔다면, <A.I.>에서 AI 피노키오(데이비드)는 로봇과 인간 구도에서 인간성을 질문한다. 영화에서는 메카(mechanic의 준말, 기계)와 올가(organic의 준말, 유기체)라는 말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도하에서 <A.I.>는 로봇과 더불어 사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더 정확히는 메카와 올가의 명확한 구분이 미래에는 더 이상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인류학적 기계’는 디스토피아 지구에서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A.I.>에서 인간은 로봇을 책임지고, 허용과 불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미래에는 상실한다. 인간은 인류세 시대에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멸망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로봇 회사들의 경쟁적인 생산으로 인해 양적으로 증가한 로봇들에게 불안을 느껴 그들을 그야말로 이용하고 폐기하거나 구경거리로 삼는 등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 <A.I.>에서 등장하는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같이 비인간적이다. 로봇 사냥꾼들은 로봇을 잡아서 플레시 페어(Flesh Fair: Celebration of Life)에 넘겨 오락용 살상을 신나게 저지른다. 그것이 플레시 페어장의 이름처럼 로봇을 살상 장난감으로 삼아 즐기는 생명의 축복(celebration of life)이다. 모니카와 헨리의 인간 아들인 마틴은 데이비드를 기망하고, 마틴의 친구들은 데이비드를 따돌린다. 지골로 조(주드 로)에게 살해 누명을 씌운 자 또한 인간이다. 홀로 된 아이 로봇을 돕는 자는 조와 테디 베어와 같은 또 다른 메카들이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세상에서 AI 피노키오인 데이비드는 엄마를 사랑하는 가장 순수한 영혼을 지닌 메카가 된다.
이러한 인간의 영혼과 메카의 육체의 혼합은 데이비드가 계속해서 피노키오를 사실이라고 믿는 그래서 동화 같은 사실이 있다고 여기는 믿음과 등치가 된다. 메카와 올가의 구분은 동화와 사실의 구분처럼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메카든 올가든 (동화 같은) 믿음은 사실을 만들고, 영혼을 가진 메카라는 유일성을 지닌 존재 또한 탄생할 수 있다.(9) 비인간적인 세계에서 잃어버린 것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는 AI 피노키오이자 메카인 데이비드이며, 그는 결국 2천 년 후 인류가 멸망하고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인류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인간 이후 존재로 외계인들에게 인정받게 된다. 데이비드는 메카와 올가의 이분법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지구에 함께 묶여 있는 생기를 지닌 존재’들이다.
지구에 묶인 자: 어린이 로봇의 눈
<A.I.>에서 데이비드가 올가와 메카, 인간과 비인간, 로봇과 인간 구도를 벗어나 하비 박사의 말대로 지구 ‘최초의 새로운 종’이라는 건 데이비드를 비롯한 AI의 눈에 대한 표현으로 드러난다. 영화는 영혼이 담긴 눈을 찾는 데이비드의 여정과도 같다. 영화 초반 데이비드의 눈은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메카의 눈이다. 데이비드는 엄마에게 버려진 후 로봇들이 버려지는 폐기물 숲에서 한 로봇이 자기 눈을 다른 로봇의 눈과 바꿔 끼는 것을 목격하면서 충격을 받는다([그림1, 2]). 비인간의 눈은 닥터 노의 홀로그램처럼 물질성을 띠지 않은 투과될 수 있는 빛과 같은 것이며, 2000년 후 지구에 도착한 외계인의 복사 스크린과 같은 눈 없는 얼굴이다([그림3, 4]). 그러나 데이비드의 눈은 몸에 부착된 눈을 지닌 인간과의 눈과도 다르며, 눈 없는 로봇과도 다르다([그림5, 6]). 데이비드는 껍데기뿐인 로봇도 아니고, 물질적인 막이 없는 채로 투영하기만 하는 비인간도 아니다. 이후 데이비드는 물에 빠져 코니아일랜드의 푸른 요정 동상에게 진짜 소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빈다. 그러면서 푸른 요정 동상과 눈(얼굴)이 겹친다([그림7, 8]). 간절한 기도 때문인지 데이비드는 하얀빛 속에서 눈을 뜨면서 엄마를 만나는 꿈을 이룬다([그림9]).
이 쇼트에서 데이비드는 마치 광명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눈을 뜬다. ‘눈’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은 데이비드를 로봇과 인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로봇이지만, 외계인에게는 인간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구에 묶여 있는 자’로 만든다. AI 피노키오는 지구 최초의 새로운 포스트휴먼 종으로 거듭난다.









스탠리 큐브릭의 우려
<A.I.>의 크리에이터 중 한 명이기도 했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SF 영화를 제작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이 작업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넘긴 바 있다. 큐브릭 감독은 AI 피노키오 시나리오가 인류가 기계로 진화하는 과학적인 지향과 기계 소년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라는 환상에 가까운 동화 사이에서의 긴장을 결국 해결하지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았다. (10) 그러면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런 영화에는 더 적당한 감독일 거라면서 <A.I.>제작을 스필버그 감독에게 넘긴 바 있다. 큐브릭 감독이 우려했던 과학과 동화의 비대칭적인 부분은 <A.I.>에서 영혼을 가진 아이 로봇 이야기는 ‘동화와 같은 사실’이라는 점을 영화 내에서 에둘러 밝히는 것으로 타협에 이른다. ‘동화 같은 사실’ 속에서 AI 피노키오는 엄마와 만나기 위해 물에 빠져 자살하고, 재생된 기억 속의 엄마(로봇처럼 보이는 엄마)와 함께 눈을 감고 영원히 잠이 든다. 유한한 인간과는 달리 2,000년 이상을 살던 AI 피노키오는 죽음마저도 자기 행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우월한 포스트휴먼 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데이비드의 AI 기능은 결정적으로 일단 알고리듬을 입력하면 그 문제해결 알고리듬을 수정하거나 학습하지 못하는 맹목성을 갖고 있다. 데이비드에게 특정 코드를 입력하면 영구전자 회로가 작동하여 데이비드는 이를 영원히 기억하게 된다.(11) 그렇기에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데이비드는 끝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피노키오가 꼭두각시, 인간, 동물, 로봇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기예모로 델 토로 감독의 <피노키오>(2022)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9) 동화와 사실의 결합은 루즈시에서 빅데이터 홀로그램인 닥터 노 Mr. Know 박사에게 조와 데이비드가 푸른 요정의 행방에 관해 묻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닥터 노에게 피노키오 동화에서의 푸른 요정의 행방을 묻기 위해 데이터 카테고리를 정할 때 조와 데이비드는 ‘동화 같은 사실 facts with fairy tales’라는 카테고리를 닥터 노에게 제시하면서 기존 범주의 절충을 시도한다. 이는 다분히 영화의 이야기 전개에 대한 자의식적인 반영을 담고 있다.
(10) Graham Allen, “Kubrick, A.I. and the Problem of Pinocchio: Reassessing the Evidence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Adaptation 14(2021) : 367~383.
(11) 모니카는 사이버트로닉스사가 보내 준 입력지침서를 보면서, 데이비드에게 순서대로 ‘덩굴, 소크라테스, 미립자, 데시벨, 허리케인, 돌고래, 튤립, 모니카, 데이비드, 모니카’를 입력한다. 그러자 데이비드의 회로를 통해 모니카를 엄마로 인지하는 알고리듬이 작동된다. 모니카의 남편인 헨리는 그 명령어가 데이비드에게 일단 한 번 입력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모니카에게 경고한다.
※ 이 글은 「피노키오, 안티 피노키오, AI」(현대영화연구, 2025)를 연재용으로 편집 분할한 4 / 7 번째 글입니다.
'연구 글모음 > 피노키오,안티 피노키오, AI'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2. 안티 피노키오 2 : 어린이 기계 혹은 아이 로봇이 말하는 것 (0) | 2025.04.19 |
|---|---|
| 4.1. 안티 피노키오 2 : <피노키오>(2022) (0) | 2025.04.19 |
| 3.1. 안티 피노키오 1 : 아감벤의 '인류학적 기계' (0) | 2025.04.18 |
| 2. 피노키오의 모험 - 어느 꼭두각시의 이야기 (0) | 2025.04.18 |
| 1. 서론: 피노키오는 왜 다시 등장하는가? (0) |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