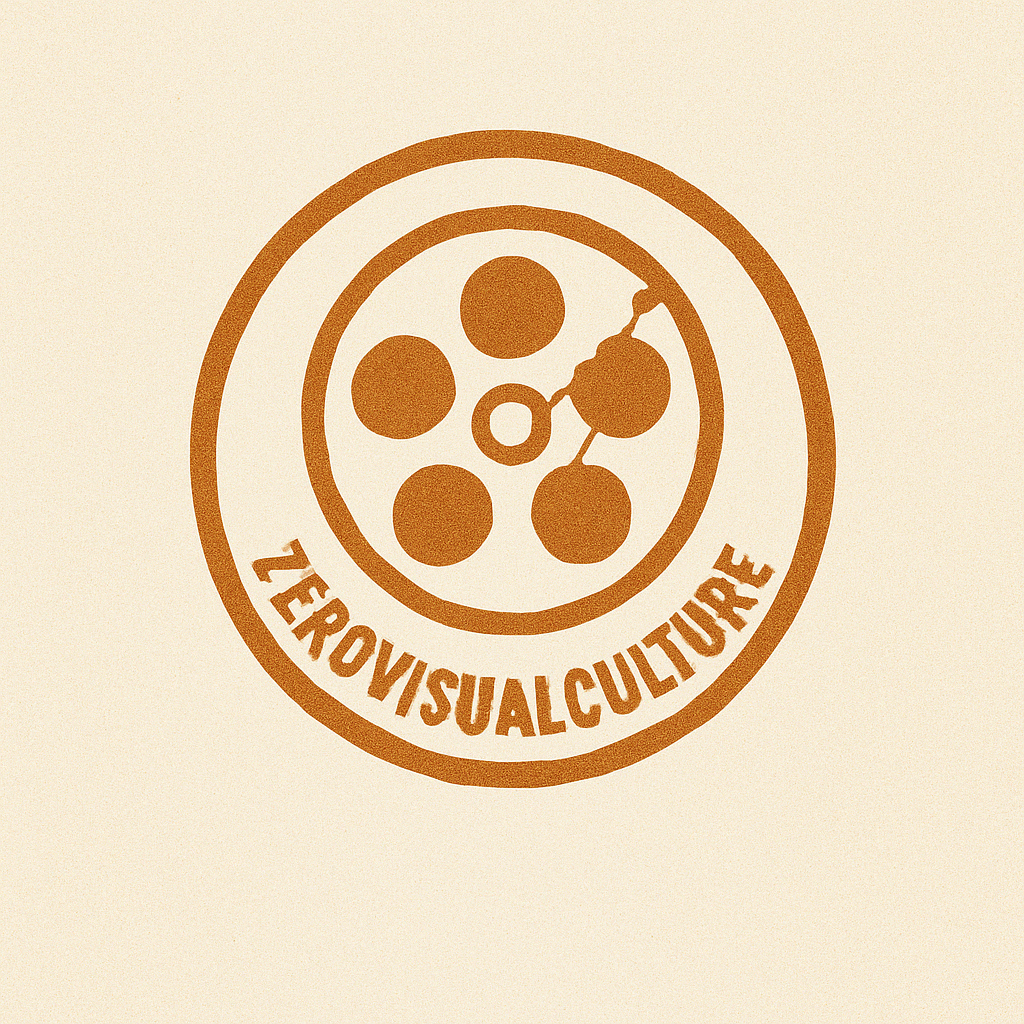Transparencies on Film by Theodor W. Adorno
※ 이 글은 New German Critique, No. 24/25, Special Double Issue on New German Cinema (Autumn, 1981- Winter, 1982), 199-205. 이 에세이는 1966년 11월 18일자 『디 차이트(Die Zeit)』에 실린 글을 바탕으로 하며, 이후 테오도어 W. 아도르노의 『Ohne Leitbild』(프랑크푸르트/마인: 수어캄프, 1967)에 수록되었다. 번역은 Thomas Y. Levin의 영어본을 따른다.
목차
1. 아버지의 영화
2. 거짓말과 해독제
3. 사실주의 영화 비판
4. 몽타주의 딜레마
5. 결론
벤야민은 자신이 영화에 대해 설정한 몇몇 범주 — 전시, 시험 — 가, 그의 이론이 반대하는 상품성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오늘날 사실주의 미학의 반동적 성격은 이 상품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실주의는 사회의 현상적 표면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표면을 꿰뚫으려는 모든 시도를 낭만주의적 시도로 간주하고 일축한다. 카메라의 눈이 영화에 부여하는 모든 의미 — 비판적 의미를 포함하여 — 는 이미 카메라의 법칙을 무효화하고, 따라서 벤야민이 설정한 타부를 어기는 것이 된다. 이 타부는 벤야민이 브레히트를 능가하려는 명시적 목표와 — 아마도 그의 숨겨진 목표였을지도 모르는 — 브레히트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고안한 것이었다. 영화는 공예예술로 퇴보하거나 단순한 다큐멘터리 양식으로 전락하지 않는 절차를 찾아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에도,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가장 분명한 해답은 몽타주다. 몽타주는 사물에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사물들을 하나의 별자리(constellation)처럼 배열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글쓰기의 배열과 유사하다. 그러나 충격의 원리에 기반한 그 절차의 생명력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순수 몽타주는, 그 구성 요소에 의도를 추가하지 않고서는, 단지 그 원리 자체로부터 의도를 도출해낼 수 없다. 모든 의미를, 특히 영화에 고유한 심리학적 의미 부여를 포기함으로써, 재현된 질료 자체로부터 의미가 떠오를 것이라는 주장은 환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이슈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통찰이 있을 수도 있다. 즉, 해석을 거부하고 주관적 요소를 덧붙이지 않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주관적 행위이며, 따라서 선험적으로 의미를 지닌다는 통찰이다. 침묵하는 개인 주체는 큰 소리로 말할 때보다 오히려 침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말한다. 과도하게 지적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했던 영화감독들은 이러한 통찰을 작업 방식에 흡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 예술에서 가장 진보적인 경향들과 영화의 경향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하며, 영화의 가장 급진적인 의도들을 손상시키고 있다. 당분간은, 분명히 영화의 가장 유망한 잠재성은 다른 매체들 — 예를 들면 특정 종류의 음악 — 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는 작곡가 마우리시오 카겔의 텔레비전 영화 《안티테제 Antithese》(4)이다.
영화가 그 기능 중 하나로 집단적 행동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추가적인 강요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집단성은 영화의 가장 내밀한 요소들 속에 본래적으로 내재해 있다. 영화가 제시하는 움직임들은 모든 내용과 의미에 앞서, 관객과 청중이 마치 퍼레이드에 참여하듯 발맞추게 만드는 모방적 충동들이다. 이런 점에서 영화는 음악과 닮아 있으며, 초기 라디오 시대에 음악이 필름 스트립과 닮아 있었다는 것과도 유사하다. 영화의 구성적 주체를 매체의 미학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이 수렴하는 하나의 “우리”로 설명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1930년대에 그레이시 필즈라는 인기 있는 영국 여배우가 출연한 영화의 제목이었던 《애니씽 고우즈 Anything Goes》(5)는, 바로 영화의 형식적 운동의 본질, 즉 모든 내용에 앞선 그 '아무거나 anything'를 포착하고 있다. 눈이 흐름에 휩쓸릴 때, 그것은 같은 어필에 반응하는 모든 이들의 (눈의) 흐름에 합류한다. 그러나 이 집단적 “아무거나”의 불확정성, 그리고 그것이 영화의 형식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오용을 용이하게 만든다. 이를테면 "사물은 변해야 한다"는 문구가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제스처를 통해 전달되는 식의 가짜 혁명적 흐림(blurring) 같은 것이다. 해방된 영화는 이러한 무의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영향의 메커니즘으로부터 그 선험적 집단성을 쟁취해야 하며, 그 집단성을 해방적 의도의 봉사에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각주
(4) 《안티테제 Antithese: 한 명의 연주자와 전자음 및 일상 소리들을 위한 영화》(1965); 1966년 4월 1일 함부르크 NDR 111에서 초연 방송됨. (영어 역자 주석)
(5) 《애니씽 고우즈 Anything Goes》(1936; 파라마운트 제작), 루이스 마일스톤 감독, 출연: 빙 크로스비, 에셀 머먼, 그레이스 브래들리(원문 표기 오류 있음) 외 다수; 콜 포터 작곡의 노래들 수록. (영어 역자 주석)
◀ 이전 글 보기 : 2. 거짓말과 해독제
▶ 다음 글 보기 : 4. 몽타주의 딜레마
'번역 아카이브 > 아도르노: 영화에 담긴 투명성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도르노 번역] 영화에 담긴 투명성들 (5/5) (0) | 2025.05.02 |
|---|---|
| [아도르노 번역] 영화에 담긴 투명성들 (4/5) (0) | 2025.05.02 |
| [아도르노 번역] 영화에 담긴 투명성들 (2/5) (0) | 2025.05.02 |
| [아도르노 번역] 영화에 담긴 투명성들 (1/5) (0) |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