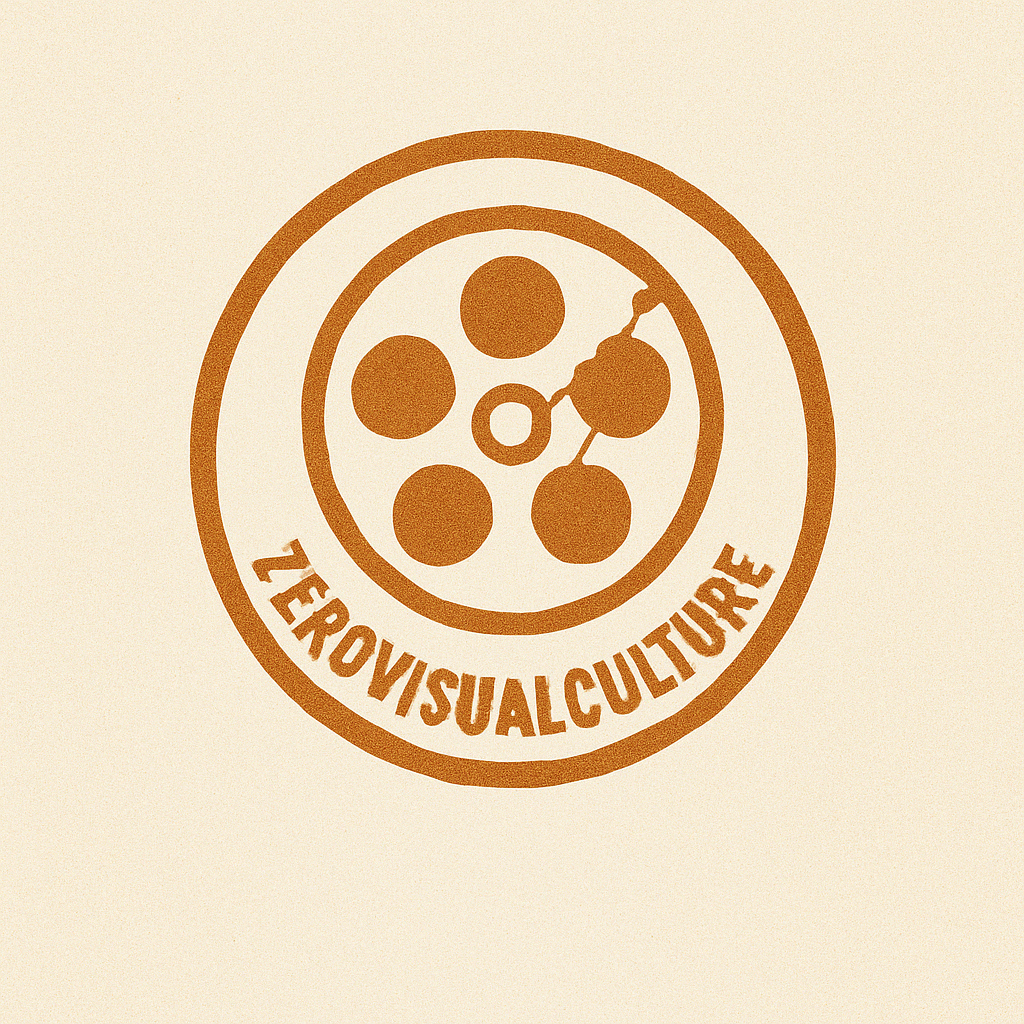[목차]
1. 영화 속 인간과 로봇 사이의 긴장
2. 비인간 인공 생명체의 정동의 문제
3. AI 정동에서 체현의 문제
4. 감정의 모빌리티
5. 나가며
최근 인공지능을 둘러싼 연구는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뿐 아니라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자질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6) 그 중에는 인공지능의 감정의 문제를 논의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천현득은 인공 감정과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논의한 글에서, 진정한 감정 로봇이 근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다.(7) 그 이유로는 로봇이 인간이 가지는 것과 같은 감정을 가지려면, 인간이나 고등 동물 이상의 일반 지능을 가지고, 유기체적 생명들과 유사한 신체를 가지며, 생명체가 흔히 처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놓여 적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공지능에 도달하는 길은 아직 멀기 때문에 현실적 구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과 맺는 일방적 감정 소통이, 로봇에 대한 심리적 의존으로 인해 사용자가 조종되거나 착취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인공 감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지적 사유능력에 버금가는 모종의 정동적 능력(affective capability)을 보유한 인공지능을 인간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8)이 존재한다. 인공지능 정동에 대한 희망적 전망에는 인공 행위자의 정동 능력이 인간과 기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개선해 기계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동시에 인공 행위자가 그들만의 자체적인 정동 상태를 가지게 될 때 그들의 부정적인 정동이 시스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9) 인공 생명체의 감정/정동 능력에 대한 이같은 관점은, 그 유용성과 위험성을 철저히 인간종중심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접근 방식이 명확히 드러난다.
한편 정희원은 19세기에 발표된 오귀스트 빌리에 드 릴아당(Auguste de Villiers de L'Isle-Adam)의 소설 <미래의 이브>(L`Eve future)의 분석을 통해 인공 생명 프로젝트가 기계적으로 갱신된 피그말리온 신화이자, 남성 주체가 자신의 욕망을 써내려간 텍스트에 다름 아님을 보여준다. 소설 속에서 에디슨(Edison)-에왈드(Ewald)라는 남성 짝패가 구현하고자 한 감정 능력을 가진 인공 생명 재현의 문제점을 “인간을 대표하는 남성 주체가 타자로서 여성-기계에게 욕망을 투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남성중심적 환상”이라고 지적한다.(10)
위 논의들에서 본 바와 같이 인공 생명체의 감정(및 정동)에 대한 학술적 담론과 문화적 재현 영역에서 드러나는 인간종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예측과 상상은 지금의 지배적인 인식 구조가 근대적 자유주의 주체로서의 서구, 백인, 남성, 인간이라는 토대, 즉 유럽 중심 휴머니즘 위에 굳건히 놓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공 생명체의 감정을 인간이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인간과 인공 생명체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에 묶어 놓은 채 사유하는 것은, 포스트휴먼에 대한 동시대 학술적 논의와도 동떨어져 있다.
주체/객체, 인간/비인간의 이항대립적 관계에 대한 해체적 관점 속에서 등장한 포스트휴머니즘 기획은 역사 시대 이래 인간종중심주의에 의해 억압된 것들과 근대적 휴머니즘 아래 주변화된 존재들을 새로운 의미에서 해체시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슈테판 헤어브레이터(Stefan Herbrechter)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에서 ‘비판적’이란 수사는 휴먼, 포스트휴먼, 비휴먼적인 것의 상호의존이나 상호침투 과정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11)라고 말하고 있다. 신유물론과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포스트휴먼 철학자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포스트휴먼 지식이 근대성의 서구적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중심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과 인간종중심주의 비판의 교차에서 생성되는 ‘조에 중심적 정의(zoe- centered justice)’로 나아가야 할 것을 주장한다. 조에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자들의 생명을 뜻하는 말로, 이때 조에 중심적 정의란 종과 국가를 가로지르는 사회적 정의를 의미한다. 인간과 비인간(in-human), 인간 아닌 것(non- human)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포스트휴먼 상황을 성찰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외의 힘들에 역량을 개방하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 모두를 아우르는 관계적 윤리학을 통한 창조적인 포스트휴먼 접근이 필요함을 웅변한다.(12)
따라서, 인공 생명체와 인간 사이에서 촉발되는 정동을 탐구하는 일은 창조적인 포스트휴먼 접근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몸이 외부 메커니즘에 의해 ‘구성’되는 주체라고 보았다. 이때 구성된다는 것은 몸의 정동하고 정동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스피노자는 정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운동, 경향성, 그리고 강도를 꼽았다.(13) 그레고리 시그워스와 멜리사 그레그(Gregory J. Siegworth & Melissa Gregg)는 스피노자의 정동에 관한 논의를 이어받아, 정동이 사이(in-between-ness)의 한가운데서, 행위하는 능력과 행위받는 능력의 가운데에서 발견된다고 말한다. 정동은 힘과 강도들(intensities)의 이행이기에, 몸과 몸을 지나는 강도들과 신체와 세계의 주위와 사이를 순환하거나 그것들에 달라붙어 있는 울림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때 정동이 발생하는 ‘몸’이라는 것이 꼭 인간에 한정되지 않고 비인간, 부분 신체 등 더 넓은 범주에서의 몸이라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14) 이러한 시각은 정동적 능력을 로봇, 사이보그, 안드로이드 등 비인간 인공 생명체에게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정동을 논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몸과 몸 사이의 강도들에서 발견되며 몸과 몸 또는 몸과 세계 사이를 순환하거나 달라붙는 정동을, 몸을 가지지 않은 인공지능에서는 대체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 것일까?
(6) 특히 최근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을 윤리 및 도덕적 행위자로서 바라보는 연구가 큰 폭으로 생성되고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이향연, 「인공 도덕행위자(AMA)가 지닌 윤리적 한계」, 《대동철학》 제95집, 대동철학회, 2021, 103-118쪽; 박균열, 「인공적 도덕행위자(AMA)의 온톨로지 구축」,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11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19, 2237-2242쪽; 김진선 ·신진환, 「도덕행위자로서 생태 인공지능」, 《윤리연구》 제137호, 한국윤리학회, 2022, 217-235쪽; 김은희, 「인공적 도덕행위자와 도덕적 책임의 문제」, 《철학논집》 제66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21, 103-132쪽; 목광수, 「인공적 도덕 행위자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목적, 규범, 행위지침」, 《철학사상》 제69집,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8, 361-391쪽 등
(7) 천현득, 「인공 지능에서 인공 감정으로-감정을 가진 기계는 실현 가능한가?」, 《철학》 제131집, 한국철학회, 2017, 217-243쪽.
(8) 강우성, 「인공지능시대의 인간중심주의와 타자화」, 《비교문학》 제72집, 한국비교문학회, 2017, 6쪽.
(9) Matthias Scheutz. “The Affect Dilemma for Artificial Agents: Should We Develop Affective Artificial Agents?,” IEEE Transactions on Affective Computing Vol.3 No.4, 2012, p.424.
(10) 정희원, 「인공행위자의 감정 능력과 젠더 이슈: <미래의 이브>와 여성 안드로이드」, 《비교문학》 제82집, 한국비교문학회, 2020, 254쪽.
(11) 슈테판 헤어브레이터, 김연순·김응준 옮김, 《포스트휴머니즘: 인간 이후의 인간에 관한 문화철학적 담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35쪽.
(12) 로지 브라이도티, 김재희·송은주 옮김, 《포스트휴먼지식: 비판적 포스트인문학을 위하여》, 아카넷, 2022.
(13) Benedict de Spinoza, The Ethics, Translated by R. H. Elwe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0.
(14)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J.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정동 이론》, 갈무리, 2015, 14쪽.
▶ 이전 글 보기 : 1. 영화 속 인간과 로봇 사이의 긴장
▶ 다음 글 보기 : 3. AI 정동에서 체현의 문제
* 이 글은 「인공지능 정동에서 체현의 문제와 감정의 모빌리티: 영화 <그녀(Her)>를 중심으로」(석당논총, 2024)를 편집 분할한 2/5번째 글입니다.
'연구 글모음 > AI의 정동, 체현, 감정의 모빌리티- 영화 <그녀>를 중심으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I의 정동, 체현, 감정의 모빌리티- 영화 <그녀>를 중심으로(5/5) (0) | 2025.05.04 |
|---|---|
| AI의 정동, 체현, 감정의 모빌리티- 영화 <그녀>를 중심으로(4/5) (1) | 2025.05.04 |
| AI의 정동, 체현, 감정의 모빌리티- 영화 <그녀>를 중심으로(3/5) (2) | 2025.05.04 |
| AI의 정동, 체현, 감정의 모빌리티- 영화 <그녀>를 중심으로(1/5) (0) | 2025.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