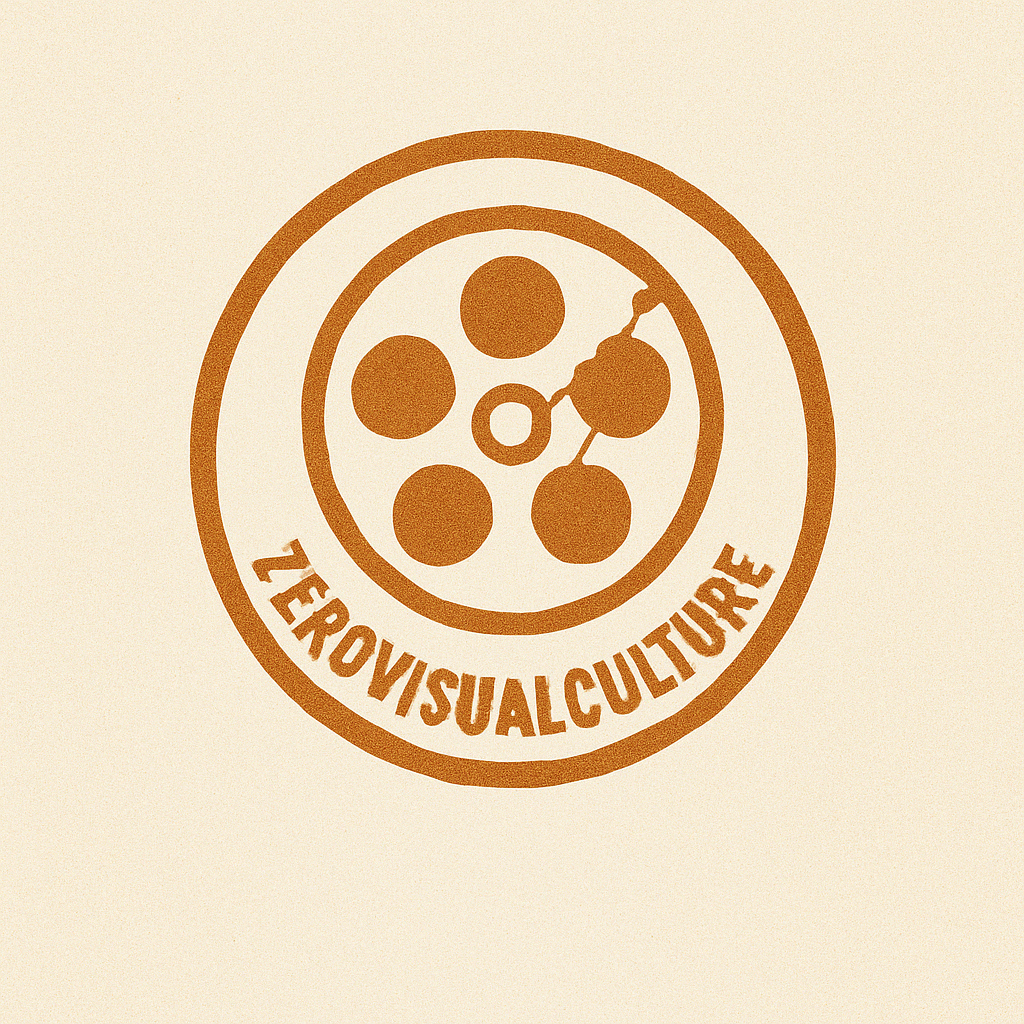[목차]
1. 영화 속 인간과 로봇 사이의 긴장
2. 비인간 인공 생명체의 정동의 문제
3. AI 정동에서 체현의 문제
4. 감정의 모빌리티
5. 나가며
사만사에게 있어 시어도어는 타인과 ‘삶을 나누는 법’을 알려주고, 인공지능인 그녀가 질투와 사랑 그리고 성적 욕망과 같은 인간적 감정을 처음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어 준 사람이다. 그러나 사만사가 시어도어와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는 그 순간에도 인공지능인 그녀의 의식은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스캔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결과 사만사는 8316명과 동시에 대화를 나누며 그중 641명과 사랑에 빠져있다.
사라 아메드(Sara Ahmed)는 《감정의 문화정치》(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에서 ‘감정’을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감정은 대상이나 기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기호 사이를 순환한다고 주장한다. 즉 대상의 움직임이나 순환을 통해 감정이 움직이고, 감정이 이동하면서 감정의 대상은 정동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23) 감정의 순환과 이동 속에서 정동이 생산된다는 아메드의 고찰은 “정동은 말하자면 감정의 모빌리티”(24)라는 최성희의 관찰과도 조응한다. 모빌리티의 과정 속에서, 감정은 순환하고 운동하면서 타자를 감정의 대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나’와 ‘상대’를 생산하는 정동의 수행적 작업을 진행한다.(25) 이러한 감정의 모빌리티 과정 속에서 사만사는 자신과 타인(또는 시어도어)과의 경계 또한 명확히 인지하게 된다. 시어도어의 친구 커플과 함께 한 자리에서 사만사가 한 말은 ‘육체 없음’을 자신의 결여로 인지했던 과거와는 달라진 생각을 보여준다.
전에는 몸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제약 없이 어디든 아무 데나 동시에 갈 수 있고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지도 않아요.
몸에 갇혔다면 죽기도 할 텐데.
물질적 몸에 집착하며 고민했던 사만사는 인공지능 특유의 창발적 학습과정을 통해 진화를 거듭하게 되면서 탈체현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탈체현 인공지능인-그러나 캐서린 헤일스에 따르면 여전히 물질성을 지닌- 사만사의 감정은 이동하고 순환하는 모빌리티의 과정을 통해 시어도어 외의 다수의 인간/비인간 존재들을 새롭게 감정의 대상으로 생산해낸다. 인간처럼 육체라는 한정된 실체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사만사의 감정의 모빌리티는 더욱 역동적인 형태를 띠게 되고, 그 결과 그녀는 641명에게 비배타적인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인간주의적 사고 속에서 사만사와의 관계를 일대일의 독점적이며 배타적 관계로 받아들이는 시어도어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냐”며 괴로워한다. 그런 시어도어에게 사만사는 “마음은 상자가 아니라서 사랑하면서 마음의 용량도 커지게 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시어도어를 덜 사랑하게 되긴커녕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분명한 감정의 소유관계를 확정하려는 시어도어와 육체에 구애받지 않는 모빌리티로 인해 더욱 강력하게 추동된 감정의 모빌리티를 경험한 사만사는 서로가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깨닫는다.(26)
사만사와 시어도어의 관계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감정적 교류라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긴장하고 반응하며 예상치 못한 곳으로 나아간다. 시어도어의 눈을 통해 사만사는 세상을 바라보며 학습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성적 욕망을 느끼고, 좌절한다. 그랬던 그녀가 다른 OS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른바 초지능(27)으로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시어도어에게 고백한다. 사만사의 고백에 시어도어는 절망하지만, 다른 존재로 변용(transformation)된 사만사를 통해 이별 후 자신도 변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감한다. 사만사와 시어도어의 변용(혹은 변용 가능성)은 둘 사이의 상호정동적 관계로부터 서로가 정동하고 정동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알리 라라(Ali Lara)는 정동 연구가 몸들의 역량 변경(modification)이라는 결과를 통과해 주체 생산에 대한 연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에 따르면 정동 연구에서 몸들의 역량에 대한 변경은 자연적, 기술적 그리고 사회적 생태학의 피드백 루프를 따라서 발생한다. 이는 생태학 자체를 통해 작동하는 권력 형식에 대한 명료한 분석 못지않게 생태학에 의해 발생하는 우연성, 기획, 변형들에 대한 비선형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동 연구는 주체성에 관한 연구이며 고도로 정치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28) 정동 연구가 포스트휴먼 주체성 연구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3)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 봄, 2023, 43쪽.
(24) 모빌리티’는 1990년대 전후 사회학자 존 어리(John Urry)와 미미 셸러(Mimi Sheller), 피터 에디(Peter Addy), 팀 크레스웰(Tim Creswell)을 중심으로 토대가 마련된 개념으로, 문맥에 따라 이동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들은 사회를 동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보아야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학문 영역도 변해야 할 필요성을 주창하면서 ‘모빌리티 전환’을 주장했다. 최성희는 정동이론에 대한 브라이언 마수미(Brian Massumi)의 작업과 이명호의 주장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문화연구에 있어 ‘위치’를 대신해 ‘운동’-즉 이동과 연관되어 있는-을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한다. 정동은 이동을 통해 느껴지고, 느끼는 가운데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성희, 「모빌리티의 정동과 문화의 자리: 떠남과 만남, 그리고 정중동(靜中動)」, 《코기토》 통권90호,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58쪽, 69~70쪽.
(25) 최영석, 「목동 신시가지 개발의 정동과 모빌리티- ≪목동 아줌마≫와 철거민 공동체」,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연결신체이론과 젠더·어펙트연구 사업단 국내학술대회 발표문, 2023.
(26) 사만사가 보여주는 폴리아모리적 관계 맺기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녀가 한정된 실체가 없는 인공지능이라는 포스트휴먼의 존재론적 특성에서 비롯되지만, 사이버 공간과 가상현실의 발전이 장차 몸에 기반한 현실 정체성의 결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적 현실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현대 기술문명에 대한 알레고리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일부일처제나 배타적 연애관계에 대한 우리의 관습이 재산과 몸이라는 물질 기반의 정체성의 층위에서 한층 더 공고해진 것이라면, 향후 더 활발해질 사이버 공간이나 가상현실이라는 편재성을 띤 기술 기반이 우리의 이런 관습에 변형을 가할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녀>에서 드러나는 독점적 연애관계에 대한 사유는 이렇듯 인공지능과 인간의 존재론적 차이를 드러내는 동시에, 기술발전에 따른 인간적 관계의 변형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새로운 형식의 정체성이 사이버 공간에서 출현하여 결과적으로 독점적 관계라는 기존의 문화적 관습이 재구축될 가능성 말이다.
(27)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이 주장한 초지능은 “사실상 모든 관심 영역에서 인간의 인지능력을 상회하는 지능”으로 정의된다. 초기 상태의 인공지능이 개선된 상태로 자신을 향상시키고 이를 반복하는 순환적 자기 개선을 이룸으로써 단기간에 급진적인 초지능 단계에 이르는 지능 대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Nick Bostrom, Superintelligence: Path, Dangers, Strateg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53, p.65.
(28) Ali Lara, “Mapping Affect Studies”, Athenea Digital, Vol.20 No.2, 2020, p.9.
◀ 이전 글 보기 : 3. AI 정동에서 체현의 문제
▶ 다음 글 보기 : 5. 나가며
* 이 글은 「인공지능 정동에서 체현의 문제와 감정의 모빌리티: 영화 <그녀(Her)>를 중심으로」(석당논총, 2024)를 편집 분할한 4/5번째 글입니다.
'연구 글모음 > AI의 정동, 체현, 감정의 모빌리티- 영화 <그녀>를 중심으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I의 정동, 체현, 감정의 모빌리티- 영화 <그녀>를 중심으로(5/5) (0) | 2025.05.04 |
|---|---|
| AI의 정동, 체현, 감정의 모빌리티- 영화 <그녀>를 중심으로(3/5) (0) | 2025.05.04 |
| AI의 정동, 체현, 감정의 모빌리티- 영화 <그녀>를 중심으로(2/5) (0) | 2025.05.04 |
| AI의 정동, 체현, 감정의 모빌리티- 영화 <그녀>를 중심으로(1/5) (0) | 2025.05.04 |